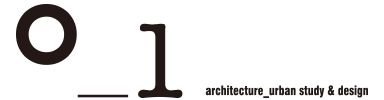solid versus void/비정기간행 잡지 versus 창간호 2008
솔리드 versus. 보이드
건축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을 채우며 단단히 들어서는
물질의 결합체이며 다른 한편으로 안과 밖의, 이웃한 환경과의,
방과 방의, 사람과 사람의 무형의 관계의 총체이다.
고 미당 서정주 시인은 ‘사과를 먹고 싶은 마음과 그리워하는
마음이 팽팽하게 유지되어야 시를 쓸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시’를 건축이라고, ‘사과’를 자연, 혹은 대지라고 생각하면
‘먹고 싶은 마음’은 채우고 싶은 마음, 즉 물질을 구축하여
존재감을 드러내고 주변환경 속에서 자신을 차별화하고자 하는
욕구로, ‘그리워하는 마음’은 형태가 에워싸는 비어있는 공간과
그것의 경험, 사람의 이야기로 형태의 무거움을 비워내며
전체의 조화된 일부로서 무형의 정신을 강조하고자 하는 욕구로
대입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두 가지의 욕구는 동전의 양면처럼 창작하는 내내 공존하여
때로 솔리드한 벽체를, 때로는 그 솔리드한 벽체가 둘러싸고
만드는 투명한 공간을 응시하게 하며 엎칠락 뒤칠락 하곤 한다.
채우고 싶은, 그리고 비우고 싶은 두 가지의 마음을 팽팽히
유지하며 대지에 시를 쓰듯 건축하는 것이란 어떻게 가능할까.
옛 집의 구조를 살펴보면 건물과 담이 외부의 마당을
바깥마당에서 안마당으로 몇 겹의 경계로 영역을 나누면서
내부와 외부공간 전체의 질서로서 ‘집’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가옥의 이전에 있었던 대지를 새로운 성격으로
만들면서 인공의 구조물이 들어서는 방식으로 채움과 동시에
비움을 구축하는 예가 아닐까 싶다.
오늘날은 자연 속에 집을 계획하는 경우보다는
인공의 도시환경 속에 더하여 건물을 계획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단위프로젝트의 크기도 점점 커지고 있다.
기존의 맥락을 압도하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계획이 잦아지면서
비우는 마음을 유지하기가 점점 쉽지 않다.
그래서 일까,
내가 사는 도시에서 ‘그리움’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